내 이름은 순디기
고 순 덕

내 이름은 順德이다. 어떤 이는 ‘순디기’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덕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아시절 젖만 먹여 놓으면 딩굴딩굴 잘 놀고, 잘 자고 순하다하여 순덕이라 이름 지었단다. 무성의한 듯 지어졌지만 난 이 이름을 오십년 동안 들으며 살아왔고, 남은 생에도 계속 듣게 될 거다. 한창 예민하던 중.고등 시절엔 내 이름에 대해 ‘순더기가 뭐람? 조선시대도 아니고....’ 짓궂은 친구들은 이름과 연관된 별명으로 나를 ‘뺑덕어멈’이라 부르기도 했다. 촌에서 나고 자라긴 했지만 촌스러워도 너무 촌스러운 이름. 텔레비전이나 소설에서도 하인이나, 2% 부족거나 보따리를 싸 야반도주하는 역할의 이름 순덕이.
이를 벗어나고파 결혼 후 첫 아이의 이름 짓기에 신중을 기했다. 누구엄마라고 해서 나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거니까. 그리고 내 아이들은 나처럼 예쁘지 않은 이름 때문에 속상해하는 일이 없길 바랬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산애’다. ‘강산애’ 성에 어울리되 중복되지 않게 하기위해 ‘에’가 아닌 ‘애’로 썼다. 그런데 문제는 출생신고. 한자 표기법을 물어왔다. “없습니다.” 한자를 생각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山자가 들어가는 여자아이 이름으로는 적당한 것을 찾기가 어려워 그냥 한글로만 등록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난 “산애엄마”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산애가 소리에 조금 예민하긴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이웃의 아이에 비해 잔병치레도 적고, 순하다하여 마을 할머니들은 “아이구 순딕아. 저머이 달마 순딕이네 순딕아.” 이런.....

그렇게 두 살 터울의 아이가 넷. 십년 넘게 출산과 육아에 빠져 살다보니 내 이름이 무언지조차 잊고 살았다. 그러다 막내 모유수유를 끝내고, 시작한 공부방 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자신을 소개할 기회가 생겼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순덕입니다. 이름은 순덕이지만 실은 악덕이구요, 얼핏 천사표 같이 보이지만 내숭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 후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내 이름에 자신감을 불어 넣고 싶었다. 내 이름은 바로 “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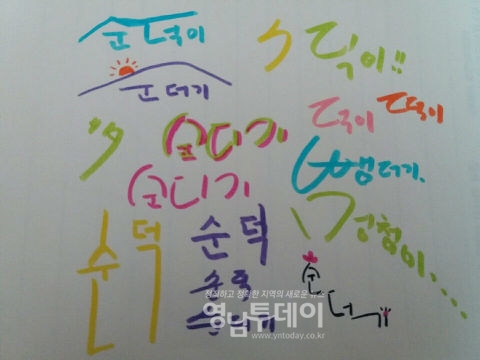
주변 사람들에게 한 때 개명이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었다. 동창회밴드에 기억나지 않는 이름이 오가고, 살림만 하는 이웃의 형님들도 사주에 맞는 이름, 예쁜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 바뀌어 진 주변인들의 이름을 어렵게 입력은 했는데, 언제나 입으로의 출력은 옛 이름. 정말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삶의 기운이 바뀔 수 있는 걸까? 나의 결론은 그저 의존심리라 내렸고, 내 이름 개명을 생각해 본 일은 없었다. 그런데 둘째가 고1 때인가? 텔레비전에서 “내 이름은 삼순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고, 이름에 대한 장난스런 토론이 벌어진 일이 있었나보다.
그런데 한 친구의 말이 “삼순이가 뭐 어때. 순덕이보단 낫지.” 했다는 거다. 그래서 둘째 왈 “순덕이가 왜. 우리 엄마가 순덕인데......” 했더니 당황해하며 친구가 다시 하는 말 “순이가 아닌게 어디야?” “순이는 우리 이모거든.....” 빵 터졌다. 당시 얘기를 나누던 여고생들도, 이를 듣고 있던 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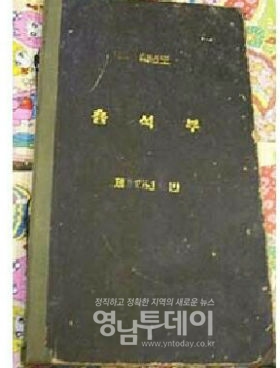
작은 오빠는 자신의 이름에 돌 석자(石)가 있어서 성적이 안나온다고 어필을 했고, 내 친구 꼬마의 동생은 마지막이라 하여 ‘말숙’이라 이름 지어졌다. 이갓집(외가)에서 태어났다하여 이남이란 이름을 얻은 남편은 마을 이장님이 면사무소에 출생신고 하러 가셔서 “이남이라 했는데..... 아! 그 집 둘째니까 二男이!!!” 그래서 두 번째 남자가 되어버린 남편. 예전에는 이처럼 이장님의 실수로 이름이 바뀌는 예도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또 재미난 이름은 어감 남다른 이름들이다.
성이 조. 이름이 진연이라는 지인이 있었다.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 ‘천정아’라는 친구를 부를 때는 고개를 들어 천정을 보며 부르기도 했다.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살라 지은 둘째 다운이는 Up and dwon으로 놀림을 받았단다. 중학교 때에는 우리 반에 이미숙, 여미숙, 최미숙이 함께 다녔던 일도 있었고, 지금 내 폰에는 미경초, 미경중, 미경고라 하여 초,중,고등의 친구들이 각각 입력되어 있고, 현재도 주변에 미경이란 이름을 가진 이가 있다.
이름은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얼굴이라 생각한다. 처음엔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분명 좋은 의미들을 넣어 작명해 주셨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가꾸고 꾸미는 것은 나의 몫.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대로 죽어 자연으로 돌아가 한줌의 거름으로 남게 되더라도 나를 기억하는 이들이 나를 얘기할 때 나오게 되는 나의 이름. 그 이름에서 향기가 나고, 웃음이 베어날 수 있도록 오늘을 채워 나가야 겠다.

